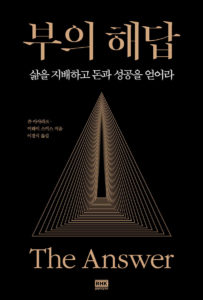서울 시내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크락션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꽤나 올라간다. 특히, 나는 강남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 한 시가 바쁜 사람들은 중간에 끼어드는 차나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지 않는 차 등이 자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지될 수 있다. 크락션은 바쁜 와중에 방해를 받아 화가 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이 잦다. 결국, 그들은 크락션을 이용하여 화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크락션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인이나 다른 차량에게 주의나 경계를 요하는 의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크락션이 화풀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본에 살 때 들었던 크락션 소리와 말레이시에 살면서 듣는 크락션 소리는 한국에서 듣는 소리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쿠, 저 사람 다치겠네.’
‘저러다 차 박겠네.’
‘신호가 바뀐 걸 모르나 보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크락션 소리가
‘왜 껴들고 난리야?’
‘신호 바뀌었는데 왜 안 가는데?’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크락션 소리와 같을 수 없다.
하루 종일 빡빡한 스케줄에 치여 운전하고 가는 시간조차 아까운 한국문화를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다급함이 조금은 예의 없음을 용서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운전자는 조그마한 차 안에서 유리창으로 보는 차 밖의 세상을, 그 사람들의 상황과 심정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운전자의 시선과 판단이 모두 옳지 않다.
다급하게 끼어든 저 운전자가 어쩌면 아이가 아파서 달려가는 중일 수도 있다. 또는 방금 전에 이 길에 합류되어 차선을 바꿔야만 할 수도 있다.
신호가 바뀐 걸 바로 인지하지 못한 저 운전자가 어쩌면 큰 슬픔에 젖어 오늘 하루가 괴로운 날일 수도 있다. 또는 꼬리물기 한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운전 속도가 느린 저 운전자가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혼자 운전을 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 또는 아기가 타고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크락션 소리가 불편하다.
크락션을 본인의 화풀이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길거리의 모든 사람이,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가 당신의 감정쓰레기통이 아니다.